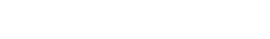CNN이 오는 25일 종이접기가 기술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하는 ‘테크 포 굿(Tech for Good)’ 에피소드를 방영한다. ‘테크 포 굿’은 종이접기의 수학적 원리가 우주공학 및 의학과 같은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혁신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디자인적 사고방식을 소개한다. CNN 앵커이자 특파원인 크리스티 루 스타우트(Kristie Lu Stout)가 종이접기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을 확인하고자 한국, 미국, 일본 세 개의 국가를 방문해 종이접기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예술가와 과학자를 만난다.
에피소드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인 일본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종이접기 디자인 분야의 개척자인 토모히로 타치(Tomohiro Tachi)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난다. 2008년 타치 교수는 다양한 표면이 삼각형의 집합으로 변화가 가능해 3D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알고리즘이 적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리가마이저(Origamizer)’를 개발했다. 최근 타치 교수는 종이접기로 디자인적 문제 해결을 돕는 상호적인 툴 프로그램인 ‘크레인(Crane)’을 연구했다. 이에 더해 타치 교수는 코야 나루미(Koya Narumi) 조교수와 함께 자극에 반응해 스스로 접히는 기능이 탑재된 소재를 인쇄하는 4D 프린터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어 크리스티 루 스타우트는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브리검영 대학교에 방문해 래리 하웰(Larry Howell) 교수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빛 감지 및 레이더 기술 망원경에 대해 알아본다. 망원경은 현재 나사(NASA)가 우주에서 사용하는 망원경의 크기보다 크지만 효율적인 형태로 설계됐다. 하웰 교수는 여행 가방 크기의 망원경을 제작하기 위해 단면, 경첩, 자석과 같은 디자인 구성 요소를 종이접기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마크 스티븐 나사(NASA) 공학자는 로켓 발사 시 크기가 최소화된 망원경을 기존 대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어 같은 비용으로 보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DNA 종이접기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김명석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DNA 종이접기 분야의 연구는 종이접기 형태에 따라 DNA의 긴 가닥에 특정 염기로 구성된 짧은 가닥을 배열해 다양한 형상으로 구현하는데 활용됐다. DNA 종이접기는 한 번만 접을 수 있었지만, 김도년 교수와 김명석 씨는 종이를 접은 후 DNA 구조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통해 산염기(pH), 빛, 핵산 분자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법을 발견했다. 이 기술은 약물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나 조기 암 발견을 위한 바이오 센서와 같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루 스타우트는 로봇공학 분야에서 종이접기가 나노기술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향한다. 마크 미스킨(Mark Miskin) 조교수는 소금 한 톨 수준의 미세한 크기를 가진 로봇이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얻은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미스킨 교수는 이를 통해 손상된 말초 신경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인류의 건강 관리 방법을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 포 굿’은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11월 26일 일요일 오전 5시, 오후 1시 및 9시에 순차적으로 CNN International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전용 온라인 페이지 또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