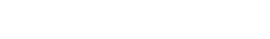인공지능이 대세다. 남산도서관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다양한 솔루션이 내손에 들려있다. 지식으로 성장을 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통찰력의 기업 문화를 위해 몇 가지 전한다.
첫째, 이종결합적 조직 체계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은 귀중한 정보보다 새로운 정보를 찾는 능력이 진화되다보면 일상 생활이 산만해져 불안 증세까지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의 프로젝트에 국한된 데이터나 정보는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 분야가 다른 책을 섞어가며 읽으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해석력이 생기는 경험을 상기해보라. 마찬가지로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를 번갈아 처리하다보면 이쪽의 인사이트가 저쪽으로 건너가 색다른 통찰로 태어난다. 스티브 잡스가 엔지니어의 전문성이 인문학의 보편성과 만나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인천 송도신도시의 광고 콘셉트가 떠오른 것은 책상위가 아니다. 신나라 레코드점 앞이였다. 대한민국 신(新)나라가 그것이다. 포도와 시간이 만나 와인이 되는 발상력은 그렇게 얻어진다.
두번째는 평가 체계에 관한 것이다. 능력이 일하고 성과가 말하게 해라. 엘스바흐(Kimberly D.Elsbach)는 두 개 그룹에 각각 다른 낱말 카드를 나누어 주었다. A그룹은 “나는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문장을, B그룹은 “나는 그가 밤늦게 주말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문장이 조합된 카드었다. 3분을 읽게 한뒤 두 그룹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A그룹은 책임감이 있고 믿음직하다고 했고 B그룹은 열성적이고 헌신적이라고 더 좋게 평가했다. ‘밤늦게 주말에’ 일하는 것이 높은 평가의 근거가 될수있을까? 디지털 세대의 평가 기준으론 전근대적이다.
세번째는 휴머니즘이다. 분절의 시대, 협상과 소통의 기본은 오히려 인간미다. 우선 미소부터 장착해라. 캐나다 맥길대의 마크 볼드윈 교수는 피조사자들의 웃는 정도에 비례해서 스트레스 수치가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웃는 아이를 모델로 써서 실패한 광고는 거의 없다. 똑똑한 친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닌 친구와 팀 과제를 하겠다는 학생들의 반응도 같은 이유다. 복장도 마찬가지다. 복장은 정체성의 대변자다.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때와 장소,상황을 고려해라. 정장이 평상복보다 복종을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이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는 백화점에서 할인받을 확률마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리액션도 잊지말라. 유재석의 장수 비결은 신동엽의 재치나 김구라의 관찰력이 아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띄우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소통력이다. ‘맞아 어쩐지!’ ‘그랬어요? 나는 왜 몰랐을까?’라는 추임새는 흉중에 숨겨진 이야기마저 끌어낸다. 이 때 경청(敬聽)은 기본이다. 경청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임금처럼 상대의 마음을 열번이나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가 자란다. 암(癌)이란 글자는 입이 세 개가 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산이 가로막아 생긴 병이란 뜻이다. 돌아가며 말해보라고 채근하지 마라. 당신의 말을 줄이고 기다려라. 그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니고 당신을 탐색 중이다. 억지로 끌려온 소가 쟁기질을 잘 할리 없다.
김시래 부시기획 부사장,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JA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