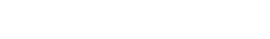4월 한달 낙성대에 있는 시민대학에서 강의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발상력이 주제였다. 세번째 강의 날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는 중세의 마녀 사냥이 보여주듯 조작된 정보가 몰고 올 폐해와 인간의 능력을 빠르게 대체하고 말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이제야말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모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배제하기 위해 암호화된 소리를 만들어 몰래 자기들끼리 교신한 사례를 들며 이들이 지구에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바야흐로 인간은 지구의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연결하고 조합시킨 지식을 순식간에 제공하는 또 하나의 두뇌를 가지게 됐다. 지식의 수준에서 보면 세상은 공평하다. 자신의 경험이 가미된 자신의 관점이 승부처다. 가령 강아지와 산책할 때 마주한 장엄한 저녁놀이나 헤어진 연인과 함께 봤던 영화를 다시 보고 떠오른 느낌은 인공지능이 흉내내지 못할 영역이다.
당신의 족적과 감정을 결합시킨 연상력을 훈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기를 써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도 좋다. 우리는 모두 생활자다. 마케팅과 대중 문화의 공감 포인트는 생활의 어떤 한 순간이다. ‘괴물’이나 ‘기생충’같은 봉준호감독의 수작들도 그의 생활 속 파편이었다. 일상의 느낌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연결해라.
강의를 마치려는데 한 수강생이 ‘조직의 업무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변화의 당위성을 다지기 위해 ‘갈란투스의 꽃’ 이야기부터 꺼내들었다. 비스마르크가 러시아 알렉산드리아 2세의 별장에 산책했을 때다. 총을 든 군인들이 화단을 경비하고 있어 그 까닭을 물었다. 대답인즉 80년전 예카테리나 여제가 산책하다 눈 속에 핀 갈란투스 꽃이 너무 이뻐 꺾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시했는데 그 후 3명의 군주가 바뀌는 동안 특별한 지시가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었다.
혁신은 발바닥의 굳은 살처럼 쓸모없이 남겨진 관습과 관행을 점검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조직 창의성의 산실, 회의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이곳의 풍토를 뒤바꿀 몇가지 방안을 전한다.
첫째, 전쟁터로 나가는 무사는 칼날부터 벼리는 법, 철저하게 준비된 아이디어를 들고 회의실에 입장해라. 회의는 개인의 의견을 조율해서 생각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재료가 신선해야 요리사 손맛이 살아나듯 경쟁력있는 결론은 틈실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전제되야 한다. 하지만 아무 준비없이 들어와서 남의 의견에 토를 달며 장단을 맞추거나 심사하듯 비평을 가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출석부의 한줄처럼 머리수만 채우고 입을 닫고 사는 방관자부터 제거해라.
둘째, 리더는 운영하되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저년차의 참여율을 독려해라. 아이폰을 디자인하는 아이디오(Ideo)는 ‘Deep Dive'라는 ‘구조화된 혼돈의 회의문화'가 이끈다.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고 다수결로 최종 의견을 정한다. 구체성과 현실성만이 선정의 기준이다. 때로 경험과 연륜은 새로운 시각의 장벽이 된다. 가보지 않은 길에 광맥이 있음을 명심해라.
세번째는 실수나 오류를 스스럼없이 인정하는 분위기다.개방적인 조직 문화는 용광로같은 회의문화에 결정적이다. 에드먼손(Amy.C.Edmonson)의 투약 실수 연구를 보자. 의료진의 실력이 뛰어날수록, 팀워크가 좋을수록, 병동 분위기가 우호적일수록 투약 실수가 많았다. 왜 였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밝혀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회의실도 마찬가지다. 회의는 무결점의 긴장 상태가 아니고 활기차게 의견을 나누고 고쳐가며 서로에게 배우는 생각의 경연장이 되야한다.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성공적인 실패‘를 장려하며 발상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맥 경화로 눈치밥과 무사안일이 만연한 조직에 가보라. 중대성과 난이도가 높은 안건일수록 입을 닫고 리더의 지시만을 기다린다. 갈란투스의 경비병도 그렇게 꽃을 지키며 그곳에서 오랜동안 서성거렸을 것이다.
김시래 부시기획 부사장,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JA교수